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의 과학 기사가 들머리를 요령있게 쉽게 풀어놓았으니 좀 빌려와 간추리자.
‘모든 동물이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은 같다. 음식을 잘게 부숴 거기에서 새로운 생체조직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원(fuel)과 구성성분을 뽑아낸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신진대사는 동물 종마다 다르다. 나무늘보는 나무에 매달려 지내는 데 필요한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철새는 대륙횡단 여행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이런 신진대사가 동물 종마다 어떻게 다르고, 또 인간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는 오랜 과학 연구의 주제였다.’
동물 종들의 서로 다른 대사를 비교 분석해 동물 진화를 연구하는 ‘신진대사의 진화’ 연구인 셈이다. 대사체(metabolite)는 세포나 조직, 생체 안의 대사 과정에 생기거나 거기에 관여하는 작디작은 분자를 통틀어 말한다. 포도당, 아미노산, 핵산, 화합물 운반체, 신경전달물질을 비롯해 다양한 소분자들이다. 당연히 동물 종마다, 신체 기관마다 에너지를 만들고 소모하는 방식이 다를 터인데, 이런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진화 과정에서 동물의 신진대사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규명하려는 연구자들도 있다.
☞ 대사(metabolism, 물질대사, 신진대사)
생물이 생명 활동을 하는 데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환경에서 얻는다. 대부분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태양의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고 당(糖)과 그밖에 식물체를 구성하는 화합물을 직접 만들어낸다. 반면 동물은 근본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할 수 없으므로 식물이나 다른 동물이 지닌 고분자 유기화합물을 섭식하고 분해해 여기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동물이 섭취한 먹이는 소화와 흡수 과정을 거쳐 생체에 이용될 수 있는 단순 화합물로 분해되고, 이런 저분자 물질은 화학반응을 거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며 세포의 구성요소를 합성·조립하는 데 사용된다. 생물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유기화합물의 모든 화학반응과 이에 수반되는 에너지 변환을 물질대사라 한다. (설명참조: 다음백과사전, 브리태니커)
최근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몇몇 포유류 동물의 특정 생체조직에 있는 대사체군(metabolome, 대사체 총칭)을 비교·분석해보니,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심지어 가장 가까운 침팬지와 비교해도, 뇌의 전두엽피질과 골격근육에서 유전학적 차이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신진대사의 차이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다.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침팬지 종과 갈라진(분기한) 뒤 600만 년 동안 음식을 먹고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모하는 신진대사 방식에서 다른 동물종들과 매우 다른 전략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다. 또한 그 변화의 속도는 "이례적일" 정도로 빨랐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와 중국 과학한림원 전산생물학연구소의 연구팀(책임저자 Philipp Khaitovich)은 최근 공개학술지 <플로스 바이올로지(PLoS Biology)>에 인간, 침팬지, 붉은털원숭이, 마우스(실험용 생쥐) 등 4종 동물의 뇌, 콩팥, 근육에서 얻은 5가지 생체조직을 대상으로 질량분석법을 이용해 1만 종 넘는 대사체들이 얼마나 다르게 분포하는지 비교 분석해 논문을 발표했다.[보도자료]
대사체의 비교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연구팀은 논문 서두에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인간의 거대한 뇌 진화는 영양이 풍부한 식생활에 대한 적응일 뿐 아니라 생체조직 간 에너지 분배의 변모와도 관련된다는 설명이 눈에 띈다.
“대체로 1500달톤(Dalton, 분자량 단위)보다 더 작은 분자량을 지니는 소분자[저분자]인 대사체(metamolite)에는 단백질 구성성분, 핵산, 지질막, 에너지와 화학그룹 운반체, 신경전달물질과 기타 신호처리 분자를 비롯해 폭넓은 성분이 포함된다. 이런 대사체 농도의 변화는 조직과 세포의 생리적 상태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인간 조직들에 특정되는 대사체 농도 변화를 알면, 인간 표현형 진화의 바탕에 있는 분자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동안 유전체와 유전자 발현 연구는 인간과 근연종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진화, 생리, 의학과 관련한 인간의 특징을 규명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연구에는 대사와 관련한 변화도 포함된다. 사실 인간에 특정된 몇 가지 생리학적 특징은 신진대사의 적응 과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체질량은 2퍼센트를 차지할 뿐이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퍼센트를 소모하는 인간의 거대한 뇌 진화는 영양이 풍부한 식생활에 대한 적응뿐 아니라 생체조직 간 에너지 분배의 변화와 관련됨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인간이 포함된 동물 4종의 생체조직 5가지에 들어 있는 소분자 1만 여 종을 질량분석법을 이용해 식별했으며 이를 비교했다.
“대사체 변화가 인간 표현형 진화에 잠재적인 의미를 던져주지만 인간에 특정한 대사 특징의 연구물은 별로 없다. 선행연구들은 인간, 침팬지, 일본원숭이의 뇌에서 21가지와 118가지 대사체를 측정한 것으로 제한되었지만, 동물종 간에 분석된 성분의 대략 50퍼센트에 달하는 영역에서 폭넓은 대사체 농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근래에 인간 진화에 동반되는 대사체 농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또한 대사체 진화의 전반적 역학에 빛을 던져주고자, 우리는 인간, 침팬지, 붉은털원숭이, 마우스의 다섯 가지 생체조직에 대해 1만 가지 넘는 대사체 성분에 바탕을 둔 광범위한 대사체군 조사를 행했다.”
'신진대사 진화의 이례적 가속현상'
![]()
연구는 10여 년에 걸쳐 진행됐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동물 종들의 대사체들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에서, 포유류 동물 종 간의 대사물질의 분기(갈라짐)가 종 간의 유전체(게놈) 차이를 보여주는 유전학적 거리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규칙적'인 경향이 확인됐다. 그러나 거기에는 눈에 띄는 ‘예외’도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우리 연구는 포유류 종 간의 대사체 분기가 종 간의 유전학적 거리를 반영하는 경향을 띠기는 하지만 또한 이런 규칙에 강건한 예외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 연구는 전두엽피질과 골격근육의 대사체군(metabolome)이 인간 진화 계통 상에서 유전학적 거리에 근거해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각각 4배, 7배나 더 큰 분기를 겪어왔음을 보여준다.”
 » 인간 진화와 머리뼈의 변화. 1.고릴라, 2.오스트랄로피테쿠스, 3.호모 에렉투스, 4.네안데르탈인, 5.슈타인하임 두개골, 6.호모 사피엔스. 출처/ Wikimedia Commons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대사 진화의 이례적 가속 현상”이라고 요약했다. 이들은 “대사체군의 진화가 주로 종 간의 유전학적 분기를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환경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면서 “그렇지만 인간 뇌의 전두엽피질과 골격근육에서는 대사 진화의 이례적인 가속 현상을 관찰했다”고 밝혔다. 유전체 차원의 진화와 대사체군 차원의 진화는 인간 전두엽피질과 골격근육에 관한 한 매우 큰 속도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 인간 진화와 머리뼈의 변화. 1.고릴라, 2.오스트랄로피테쿠스, 3.호모 에렉투스, 4.네안데르탈인, 5.슈타인하임 두개골, 6.호모 사피엔스. 출처/ Wikimedia Commons 연구팀은 이런 결과를 “대사 진화의 이례적 가속 현상”이라고 요약했다. 이들은 “대사체군의 진화가 주로 종 간의 유전학적 분기를 반영한다는 점, 그리고 환경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다”면서 “그렇지만 인간 뇌의 전두엽피질과 골격근육에서는 대사 진화의 이례적인 가속 현상을 관찰했다”고 밝혔다. 유전체 차원의 진화와 대사체군 차원의 진화는 인간 전두엽피질과 골격근육에 관한 한 매우 큰 속도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인간의 골격근육 대사체군이 인간 고유의 식생활이나 생활문화에서 비롯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실험을 벌였다. 한 달가량 붉은털원숭이한테 인간의 음식을 주고 인간 생활문화에서 지내게 한 다음에 이들의 대사체군 변화를 조사했다. 거기에선 별다른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연구팀은 인간의 골격근육 대사체군의 변화가 환경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게 아니며 오랜 진화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른 실험에서는 인간 골격근육 대사체군 변화가 매우 약한 근력을 초래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팀은 인간의 근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침팬지, 원숭이와 사람 간의 힘겨루기 실험을 여러 차례 벌였는데, 모든 실험에서 침팬지와 원숭이는 청년이나 운동선수들보다 강한 근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팀의 보도자료는 "실험에 참가한 모든 인간 참가자들보다 침팬지, 원숭이들은 2배 이상의 강한 근력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뇌의 강화, 근육의 약화’ 왜?
![]()
인간 진화 과정에서 이런 대사 진화의 특징은 왜 나타났을까?
이런 연구결과를 설명하는 데에는 대체로 두 가지 가설이 제시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한 가지는 이번 연구팀도 동의하는 가설로서, 인간 몸이 두뇌, 특히 전두엽피질을 크게 발달시키다보니 거기에 소모되는 큰 에너지를 제공하다보니 근육의 대사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근력의 약화가 초래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우리 연구결과는 에너지 소모가 큰 인간 뇌에 에너지를 할당하다 보니 골격근육의 에너지 소비는 좀 더 줄어들을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반론의 가설도 여전히 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인간진화생물학자인 대니얼 리버먼(Daniel Liberman) 미국 하버드대학 교수는 이런 결론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인간이 일찍이 달리기와 오래 걷기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췄는데 이런 능력 덕분에 더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큰 뇌를 갖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종류의 근력이기는 하지만 근력 덕분에 인간은 더 큰 뇌와 전두엽피질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 논문 저자 요약(Author Summary)
“우리 생체조직 기능을 유지하는 생리적 과정에는 대사체(metabolite)로 알려진 여러 산물과 매개물의 생산이 관여한다. 이들은 1500달톤보다 더 작은 분자량을 지니는 소분자들이다. 이런 대사산물 농도 변화(change)는 표현형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여겨진다. 이번 연구에서, 우리는 인간, 침팬지, 일본원숭이(macaque monkey), 마우스를 대상으로 질량분석법 기반 방법을 사용하여 3곳의 뇌 영역과 2곳의 비신경 조직(골격근육과 신장)에 있는 1만 종 넘는 대사산물의 농도를 평가했다. 우리는 대사체군(메타볼롬, metabolome)의 진화가 주로 종 간의 유전적 분화를 반영하며 환경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음을 발견했다. 그렇지만 인간 계통에서, 우리는 뇌의 전두엽피질 그리고 골격근육에서 대사체 진화의 이례적인 가속 현상을 관찰했다. 후속의 행동시험에 바탕을 두어, 우리는 더 나아가 인간 근육의 대사체 변화가 근력의 급격한 감소와 병립하는 것으로 여겨짐을 보여주었다. 뇌와 근육에서 관찰되는 빠른 대사체 변화는 독특한 인간 인지 기술과 낮은 근육 수행력과 더불어, 인간 진화에 나타나는 병렬적 메커니즘을 반영한다 할 것이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한겨레 과학웹진 사이언스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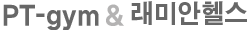
 가슴운동의 처음과 끝 완벽정리
가슴운동의 처음과 끝 완벽정리
 견갑대에 정렬과 통증
견갑대에 정렬과 통증







